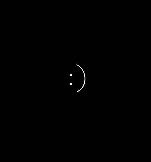내공간
엉망이 된 장애인 본문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 당사자이자 대표를 탄핵하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졌습니다. 탄핵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장애인 활동가가 단체 운영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고 싶어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그에 따르지 않자 내쫓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요?
단체는 분명 조직체계와 규칙이 있을 텐데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 번입니다. 특히 내가 있는 곳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단체 운영에 권한 없이 개입하며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장애인만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실무환경에서는, 장애인이 모두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 부분을 비장애인 활동가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만의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장식품’처럼 내세우거나 도구로 사용하는 반면, 반대로 비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필요에 따라 ‘활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비장애인 여성을 장애남성 들이 본인의 빛나게 하기 위해 실무를 도맡았고, 10년 동안 권한 없이 활동가의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비장애여성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장애여성의 공백에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반대로 권력을 쥐게 되며, 비장애인 활동가를 배제하거나 도구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한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장애인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한국 장애인 운동은 당사자들의 요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점점 수단이 되고 있고, 반대로 비장애인이 어떤 역할과 목소리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봐야지 않을까?